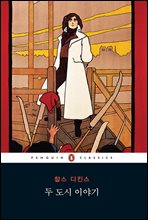
1857년 작
2017. 2. 읽음
꽤 두꺼운 책이라 칩거기간동안 읽으려 했는데, 잠만 자느라 ㅡ.ㅡ
이동하는 중에 읽느라... 들고 다니느라 어깨가 아팠던...ㅜㅜ
다 읽고 나니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모든것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모두들 천국으로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라는 구절이 확 와닿았다. 꼽히는 표현인데는 다 이유가 있는거지...
초반 인물 설명때는 너무 루즈하고 설명이 장황해서 읽기가 힘들었다.ㅜㅜ
특히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얼굴석상이 늘어났다? (??)는 식의 애매한 표현이 많아서 ㅋㅋㅋㅋ 더 힘들어따...
각자의 이야기가 얽힌 이야기가 되면서 흥미진진해지는데...
난 프랑스혁명에 대해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켰고, 왕족들을 기요틴으로 처형했다.'는 정도까지만 알고있었을 뿐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얽혀서 죽었다고 상상도 못했고
시민들의 분노가 이런 수준일줄은 생각도 못했다.
처절한 마음으로 한자한자 써내려갔을 마네트박사의 편지.
그 편지가 자신의 사위를 옭아맬줄은 생각도 못했을 마네트박사의 절망적인 마음은 아마 내가 가늠할수도 없는 정도겠지
그래서 결국 과거로 퇴행해버린 마네트박사가 슬펐고
왜 그렇게 분노로 가득차 있을까 생각했던 드파르주의 부인, 그녀의 마음이 이해가기도 했다. 정말 어처구니없이 언니와 동생을 잃게된다면.. 그리고 당연한 권리도 못누리는 소작농의 삶이라니.
어쩌면 혁명은 당연히 일어났을 일인것 같아서 슬프다.
시드니카턴이 다네이 대신 기요틴으로 간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마네트박사와 루시를 계속 가까이서 봐 왔고
그들의 착한 심성을 알고 있더라면...
그리고 자기자신에게 애착이 없는 그 라면 가능한 일일수도 있겠단 생각도 들고... '-'
p. 133
슬프고 슬프게도 태양은 떠올랐다. 햇빛이 비친 광경에서 무엇이 그 남자의 일생보다 더 슬프겠는가 뛰어난 능력과 선량한 심성을 가졌지만 그것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자신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쓰지 못하며, 자신을 파먹는 해충인지 알면서도 그 해충이 자신을 먹어치우도록 보고만 있는 남자였다.
- 시드니 카턴의 묘사.
'도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캔들세계사2 / 이주은 (0) | 2019.04.24 |
|---|---|
| 찌라시한국사 / 김재완 (0) | 2018.12.11 |
| 끝나지 않는 여름 / 넬레 노이하우스 (0) | 2017.01.30 |
| 웃지않는 수학자 / 모리 히로시 (0) | 2017.01.05 |
| 도리언그레이의 초상 / 오스카 와일드 (0) | 2016.11.16 |